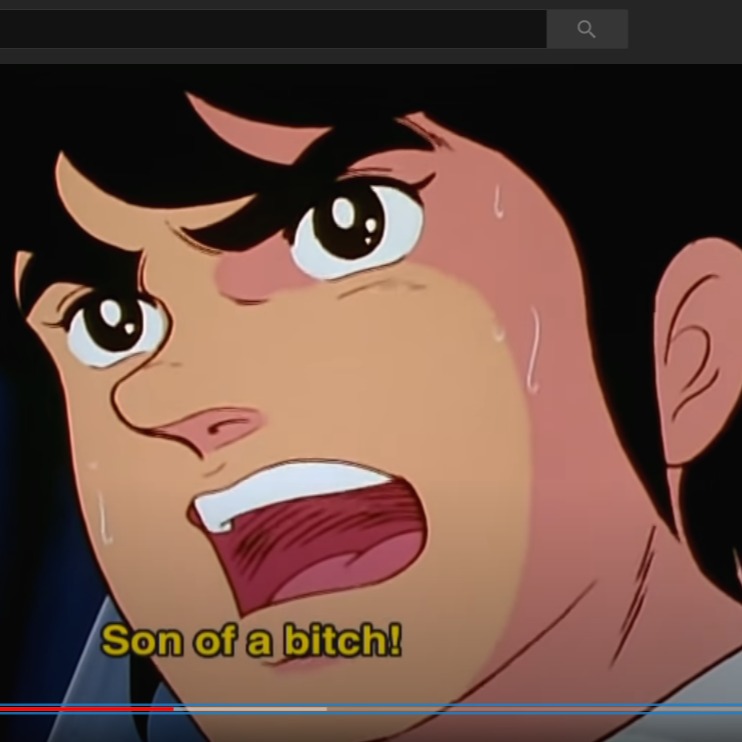--- 어느날 백택은 문득 생각했다. '나보다 오래 산 것이 있을까?' 다음 순간 백택은 지구를 벗어났다. 칠흑 속을 신수는 유영해 나아갔다. 한참을 헤엄치다 입을 열어 소리쳤다. "거기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요히 메아리쳤다. 백택은 덜컥 겁이 났다. 이곳을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뒤를 돌았다. 정신 없이 팔을 뻗어 출발했던 행성으로 스몄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랬군요."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은 다음 자물쇠로 걸어 잠가버렸어." 그리 말하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외로워보였다. 카가치는 그런 그의 이야기를 그저 듣고있었다. - "저도 가게 해주세요." 그의 음성이 웅웅 울렸다. 진동하는 그것이 수면을 찰박거리게 했다. 왜 그곳에 ..
*수위 --- 오니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서툴렀다. 백택은 잠시 벙쪄보였으나 이내 희미하게 웃었다. 뻣뻣하게 경직된 얼굴 너머로 그 속의 긴장과 초조함이 느껴지는 듯했다. 회색빛이 도는 얼굴이 왜인지 평소보다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받아줄게. 서슴없이 그리 말하는 남자를 바라보는 오니의 시선은 이젠 되려 의심을 품고 있었다. - "오야, 왔냐." 그렇게 말하는 백택의 얼굴이 무심했다. 그런 후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품의 여자에게 야살스레 웃어보였다. 불청객의 난입에 당황했는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하는 여성을 붙잡는 남자의 손길이 안쓰러울 정도로 다급했다. 그러한 광경을 오니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해 문 앞에서 자리를 비켜주었다. 문소리의 이후로 가게의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벙쪄있다..
;반응이나 기타의 현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계系에 가하는 에너지(자극)의 최소치. --- #1. 끈질긴 매달림이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밀쳐냈다. 그 손길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오니는 쉬이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결국 내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자부심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저 막무가내로 이미 상처투성이인 몸을 몇 번이고 가시투성이 밭으로 들이박아오던 것인지. 꽤나 오랜 시간이었다. 자신은 그저 가늠할 수 밖에는 없지만, 아마도 수명을 가진 존재에게 있어-제 아무리 몇천년을 산다하여도-무시할 수 없는 세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손을 뻗어오는 오니를 백택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제는 좀 잠잠해졌을까, 이제는 그 마음이 조금은 바랬을까, 그..
--- 천국에도 계절이 있나, 바보스럽게도 그리 생각하고 말았다. 천계와 저승은 어찌되어도 행성에 위치해 있으니 인세와 같이 태양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한다. 따라서 날씨와 계절이 있어 마땅하다. 한편으로 하늘로 솟는다고, 또는 땅으로 꺼진다고 다다를 수 있는 곳도 아닌, 말하자면 다른 차원의 세계이므로 사사로운 물리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지자면 다채로운 인세의 흉내를 내는 것일 뿐이다, 만약 그런 것이 정말로 있다면. 헛웃음이 나온다. 알고 있는데도. 언제보다도 세월의 흐름을 갈구하게 된다. 따스함과 추움, 비와 눈으로써 덮어버리고 싶어진다. 한 줄기 비가 떨어진다. 멍하니 어둑한 하늘을 올려다본다. 톡, 하고 볼을 때리는 것을 가만히 둔다. 눈을 감는다. '연모하고 있습니다.' 메아리 울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