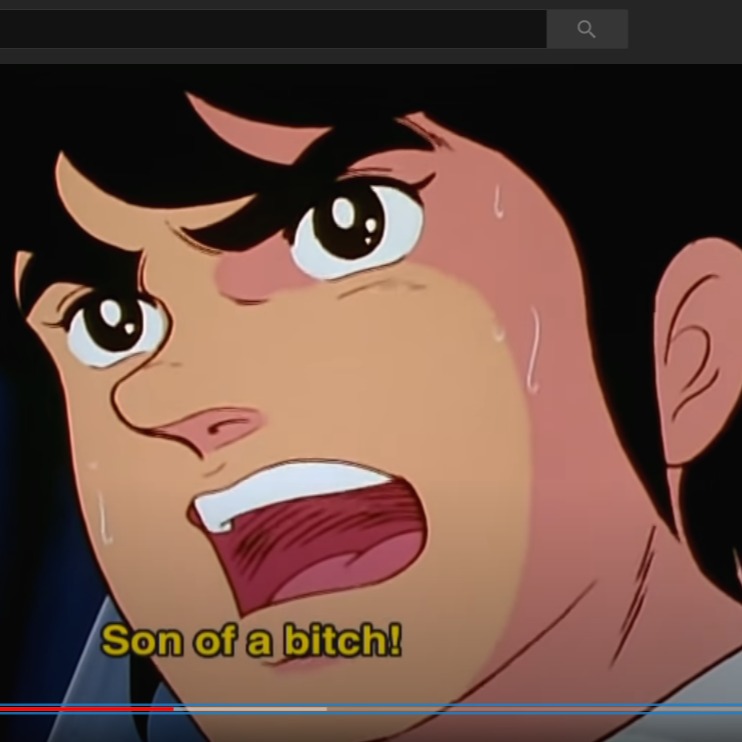티스토리 뷰
;반응이나 기타의 현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계系에 가하는 에너지(자극)의 최소치.
---
#1.
끈질긴 매달림이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밀쳐냈다. 그 손길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오니는 쉬이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결국 내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자부심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저 막무가내로 이미 상처투성이인 몸을 몇 번이고 가시투성이 밭으로 들이박아오던 것인지. 꽤나 오랜 시간이었다. 자신은 그저 가늠할 수 밖에는 없지만, 아마도 수명을 가진 존재에게 있어-제 아무리 몇천년을 산다하여도-무시할 수 없는 세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손을 뻗어오는 오니를 백택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제는 좀 잠잠해졌을까, 이제는 그 마음이 조금은 바랬을까, 그런 옅은 희망아닌 희망만이 머리 속을 동동 떠다녔다. 백택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타이르는 말이었고, 세월에 까슬하게 일어난 결을 쓰다듬는 말이었다. 말도 안돼.
오래 사는 것들은 정적이다. 그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하물며 그는 신수다. 그의 마음은 너무도 게을렀고, 둔했다. 좀처럼 반응이 없는 그것에 아주 조금이라도 진동을 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에 성공했을 때, 그것은 파동처럼 그의 온몸에 퍼졌다. 마치 죽음의 시간을 건너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끈적한 액체에 흥건하게 젖은 온몸을 세차게 털어내듯, 결이 맞은 파동처럼 배가 되고 배가 된 그 움직임은 마침내 태풍과도 같이 그의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다. 오직 한 차례 혹독한 것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는 겨우 뭔가의 변화를 알아챈 듯, 엉망진창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망연히 자신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다 쉬어버린 목으로 힘겹게 말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봐. 오니는 그런 그에게 손을 뻗었다. 거부하지 않는 팔을 힘주어 잡아올려 그를 일으켜세웠다. 휘청하며 쓰러지려는 신수를 품에 안았다. 금방이라도 식어버릴 듯한 온기가 애를 태웠다. 당신의 패배입니다. 오니는 미동도 없이 늘어진 그의 귓바퀴에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가르쳐드리지요. 하나하나씩."
-
#2.
"우쭐해하지마."
백택은 빈정거렸다. 웃음을 머금은 그 눈은 남자를 향하고있지 않았다. 오니는 그저 그의 앞에 서있을 뿐이다. 백택은 가운 주머니에서 감초 조각을 꺼내 자신의 입에 집어넣고 씹었다. 입안이 마를 때면 종종 그러고는 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착지근한 미각이 입안에 퍼진다. 익숙한 맛이었다. 백택은 눈을 감고 그것을 음미했다.
"너도 잘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오즈키의 입에도 그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물려주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것을 이로 으깨는 남자를 쳐다보자니 그만 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았어."
"압니다."
"오니, 내가 너보다 모르는 것이 진정 있을거라 생각해?"
"......"
"너는 나에게 그랬지. '당신은 사랑을 모른다'고."
"......"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했어."
"그렇지만 저를 상대로는 처음이잖습니까."
호오즈키의 말에는 일종의 확신이 들어차있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인지, 백택은 묻지 않았다. 아아, 어쩌나. 네가 잘못 알고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두 눈과 귀를 닫고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저 팔을 뻗어 호오즈키의 몸을 감싸안았다.
"단언할 수 있어? 내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듣지 않은 채로 백택은 호오즈키의 까슬한 입술 위에 제 것을 포개었다. 쓰고 달달한 것이 훅 퍼졌다. 고요히 내려앉은 눈동자를 음미하며 눈을 감았다. 기다렸다는 듯 제 몸을 더듬어오는 달아오른 손길을 느끼며 백택은 호오즈키의 등팍을 어루만지던 두 팔을 천천히 밀어올려 그의 머리를 헤집었다. 노래하듯한 속삭임이었다. 알고있으면서, 바보.
---
---
#1.
끈질긴 매달림이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밀쳐냈다. 그 손길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오니는 쉬이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결국 내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자부심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저 막무가내로 이미 상처투성이인 몸을 몇 번이고 가시투성이 밭으로 들이박아오던 것인지. 꽤나 오랜 시간이었다. 자신은 그저 가늠할 수 밖에는 없지만, 아마도 수명을 가진 존재에게 있어-제 아무리 몇천년을 산다하여도-무시할 수 없는 세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손을 뻗어오는 오니를 백택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제는 좀 잠잠해졌을까, 이제는 그 마음이 조금은 바랬을까, 그런 옅은 희망아닌 희망만이 머리 속을 동동 떠다녔다. 백택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타이르는 말이었고, 세월에 까슬하게 일어난 결을 쓰다듬는 말이었다. 말도 안돼.
오래 사는 것들은 정적이다. 그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하물며 그는 신수다. 그의 마음은 너무도 게을렀고, 둔했다. 좀처럼 반응이 없는 그것에 아주 조금이라도 진동을 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에 성공했을 때, 그것은 파동처럼 그의 온몸에 퍼졌다. 마치 죽음의 시간을 건너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끈적한 액체에 흥건하게 젖은 온몸을 세차게 털어내듯, 결이 맞은 파동처럼 배가 되고 배가 된 그 움직임은 마침내 태풍과도 같이 그의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다. 오직 한 차례 혹독한 것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는 겨우 뭔가의 변화를 알아챈 듯, 엉망진창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망연히 자신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다 쉬어버린 목으로 힘겹게 말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봐. 오니는 그런 그에게 손을 뻗었다. 거부하지 않는 팔을 힘주어 잡아올려 그를 일으켜세웠다. 휘청하며 쓰러지려는 신수를 품에 안았다. 금방이라도 식어버릴 듯한 온기가 애를 태웠다. 당신의 패배입니다. 오니는 미동도 없이 늘어진 그의 귓바퀴에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가르쳐드리지요. 하나하나씩."
-
#2.
"우쭐해하지마."
백택은 빈정거렸다. 웃음을 머금은 그 눈은 남자를 향하고있지 않았다. 오니는 그저 그의 앞에 서있을 뿐이다. 백택은 가운 주머니에서 감초 조각을 꺼내 자신의 입에 집어넣고 씹었다. 입안이 마를 때면 종종 그러고는 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착지근한 미각이 입안에 퍼진다. 익숙한 맛이었다. 백택은 눈을 감고 그것을 음미했다.
"너도 잘 모르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오즈키의 입에도 그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물려주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것을 이로 으깨는 남자를 쳐다보자니 그만 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았어."
"압니다."
"오니, 내가 너보다 모르는 것이 진정 있을거라 생각해?"
"......"
"너는 나에게 그랬지. '당신은 사랑을 모른다'고."
"......"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했어."
"그렇지만 저를 상대로는 처음이잖습니까."
호오즈키의 말에는 일종의 확신이 들어차있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인지, 백택은 묻지 않았다. 아아, 어쩌나. 네가 잘못 알고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두 눈과 귀를 닫고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저 팔을 뻗어 호오즈키의 몸을 감싸안았다.
"단언할 수 있어? 내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듣지 않은 채로 백택은 호오즈키의 까슬한 입술 위에 제 것을 포개었다. 쓰고 달달한 것이 훅 퍼졌다. 고요히 내려앉은 눈동자를 음미하며 눈을 감았다. 기다렸다는 듯 제 몸을 더듬어오는 달아오른 손길을 느끼며 백택은 호오즈키의 등팍을 어루만지던 두 팔을 천천히 밀어올려 그의 머리를 헤집었다. 노래하듯한 속삭임이었다. 알고있으면서, 바보.
---
'호오즈키의 냉철 > 2차 창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귀백]COSMOS (1) | 2017.03.31 |
|---|---|
| [귀백]신수라는 존재 (2) | 2016.07.19 |
| [귀백]꿈틀거림 (0) | 2016.06.05 |
| [귀백]여름 장마, 닿지 않는 말 (0) | 2016.05.31 |
| [귀백]우러르다 (0) | 2016.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