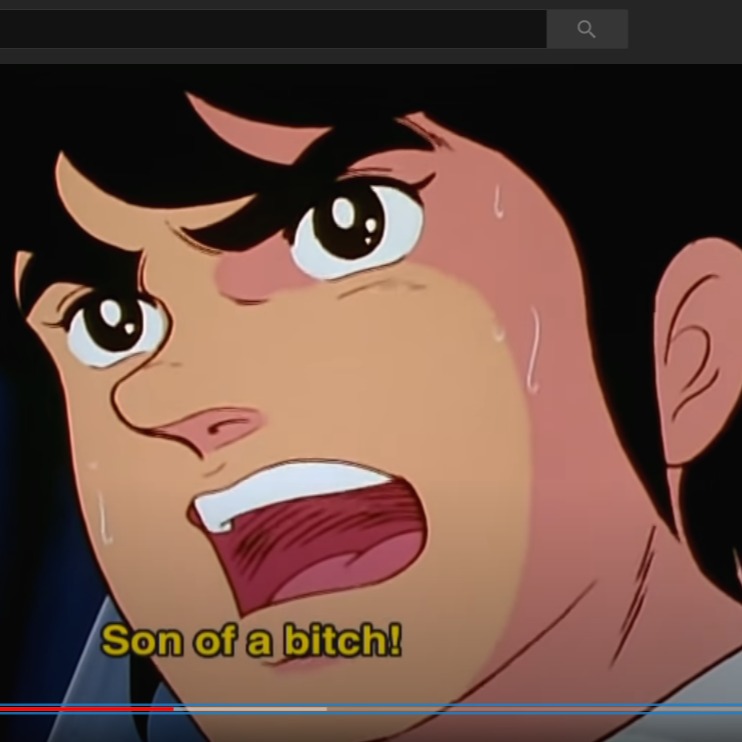티스토리 뷰
---
"꿈틀거림."
"...꿈틀거리는 것 말입니까. 태동이군요."
"그렇지. 생명의 원초이자, 조건이지."
대화는 극락만월 안,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던 백택이 돌연 말을 꺼내며 시작되었다. 종종 한 번씩 그랬다. 두서없이 생뚱맞은 말을 하는 그의 표정은 굉장히 많은 것을 품고있는 듯하기도 했고, 동시에 텅 비어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의 모든 것에서 세월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땅과 바다, 하늘이 생겨난 세계였고, 새카만 우주였으며 곧 시공간 그자체였다. 그럴 때마다 새삼 느끼는 것이었다. 호오즈키는 그러한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내에서 최대한의 대답을 돌려주었다. 미지는 언제나 흥미롭다. 알고 싶고, 파헤치고 싶고, 가지고 싶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느끼는 방식.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완벽하게 다른 것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백택은 입을 다물었다. 호오즈키 또한 입을 열지 않았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신수의 옆에서, 자신 또한 오후 햇살의 상념에 빠져들었다. 서로의 생각이 어쩌다 가로지를지, 어쩌면 맞닿을지, 그런 작은 의문들을 삼키며.
-
"아이야."
마주보는 얼굴 뒤로 세상이 기울어져있었다. 감았던 눈을 열고 게슴츠레하게 그런 그를 쳐다보던 호오즈키가 곧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이가 아닙니다."
백택의 눈길에는 변화가 없었다. 어찌 아이가 아니라고 하느냐, 타박에 가까운 의문이 눈동자에 깃돌고 있었다. 그에 호오즈키는 뭐라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무구한 것으로 빽빽히 채워진 눈길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만 것이다.
"이래봬도 꽤나 오래 산 몸입니다."
말그대로였다. 그리고 유일한 항변이었다. 저승에서도 이정도면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훨씬 오랜 세월을 보내온 존재들도 많이 있다. 제아무리 그렇다 한들, 자신을 아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은 절대로 되지 못하였다. 적어도 그는 그리 믿으며 살아왔다. 그것은 일종의 징표와도 다름없었다. 인정과 걸맞은 대접, 그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과연 신수에게도? 호오즈키는 그 물음을 꾹 눌러 씹었다. 동시에 그에게 백택이 던지고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난들 좁혀질 수 없는 격차였다. 그만한 날들을 자리하며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러한 것에는 전혀 경험이 없다. 쥐꼬리 같은 세월의 그림자가 경멸스러웠다. 꼭대기를 올려다보기에 너무 높은 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분명 남는 것은 절망뿐일 것만 같았다. 결국 호오즈키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멀군요. 그는 그리 중얼거렸다. 여전히 자신을 향해있는 두 눈이 가만히, 그리고 깊이 수긍하는 것 같아서, 모르는 사이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다. 백택은 여전히 말이 없다. 호오즈키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종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다. 알지 못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아직 내가 흥미롭습니까. 그리 묻고 싶었다. 서로가 맞닿을 것이라고, 아니, 언젠가 단 한 번은, 스칠 것이라 생각합니까. 대답을 구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애원하는 듯했다. 영겁을 존재해온 신수는 아무 말이 없다. 그랬기에 호오즈키 또한 답을 알 수 없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 햇살의 침묵이었다.
---
"꿈틀거림."
"...꿈틀거리는 것 말입니까. 태동이군요."
"그렇지. 생명의 원초이자, 조건이지."
대화는 극락만월 안,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던 백택이 돌연 말을 꺼내며 시작되었다. 종종 한 번씩 그랬다. 두서없이 생뚱맞은 말을 하는 그의 표정은 굉장히 많은 것을 품고있는 듯하기도 했고, 동시에 텅 비어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의 모든 것에서 세월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땅과 바다, 하늘이 생겨난 세계였고, 새카만 우주였으며 곧 시공간 그자체였다. 그럴 때마다 새삼 느끼는 것이었다. 호오즈키는 그러한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내에서 최대한의 대답을 돌려주었다. 미지는 언제나 흥미롭다. 알고 싶고, 파헤치고 싶고, 가지고 싶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느끼는 방식.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완벽하게 다른 것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백택은 입을 다물었다. 호오즈키 또한 입을 열지 않았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신수의 옆에서, 자신 또한 오후 햇살의 상념에 빠져들었다. 서로의 생각이 어쩌다 가로지를지, 어쩌면 맞닿을지, 그런 작은 의문들을 삼키며.
-
"아이야."
마주보는 얼굴 뒤로 세상이 기울어져있었다. 감았던 눈을 열고 게슴츠레하게 그런 그를 쳐다보던 호오즈키가 곧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이가 아닙니다."
백택의 눈길에는 변화가 없었다. 어찌 아이가 아니라고 하느냐, 타박에 가까운 의문이 눈동자에 깃돌고 있었다. 그에 호오즈키는 뭐라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무구한 것으로 빽빽히 채워진 눈길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만 것이다.
"이래봬도 꽤나 오래 산 몸입니다."
말그대로였다. 그리고 유일한 항변이었다. 저승에서도 이정도면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훨씬 오랜 세월을 보내온 존재들도 많이 있다. 제아무리 그렇다 한들, 자신을 아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은 절대로 되지 못하였다. 적어도 그는 그리 믿으며 살아왔다. 그것은 일종의 징표와도 다름없었다. 인정과 걸맞은 대접, 그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과연 신수에게도? 호오즈키는 그 물음을 꾹 눌러 씹었다. 동시에 그에게 백택이 던지고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난들 좁혀질 수 없는 격차였다. 그만한 날들을 자리하며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러한 것에는 전혀 경험이 없다. 쥐꼬리 같은 세월의 그림자가 경멸스러웠다. 꼭대기를 올려다보기에 너무 높은 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분명 남는 것은 절망뿐일 것만 같았다. 결국 호오즈키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멀군요. 그는 그리 중얼거렸다. 여전히 자신을 향해있는 두 눈이 가만히, 그리고 깊이 수긍하는 것 같아서, 모르는 사이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다. 백택은 여전히 말이 없다. 호오즈키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종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다. 알지 못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아직 내가 흥미롭습니까. 그리 묻고 싶었다. 서로가 맞닿을 것이라고, 아니, 언젠가 단 한 번은, 스칠 것이라 생각합니까. 대답을 구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애원하는 듯했다. 영겁을 존재해온 신수는 아무 말이 없다. 그랬기에 호오즈키 또한 답을 알 수 없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 햇살의 침묵이었다.
---
'호오즈키의 냉철 > 2차 창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귀백]신수라는 존재 (2) | 2016.07.19 |
|---|---|
| [귀백]역치 (0) | 2016.06.06 |
| [귀백]여름 장마, 닿지 않는 말 (0) | 2016.05.31 |
| [귀백]우러르다 (0) | 2016.05.27 |
| [귀백]거의 모든 것의 DNA (0) | 2016.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