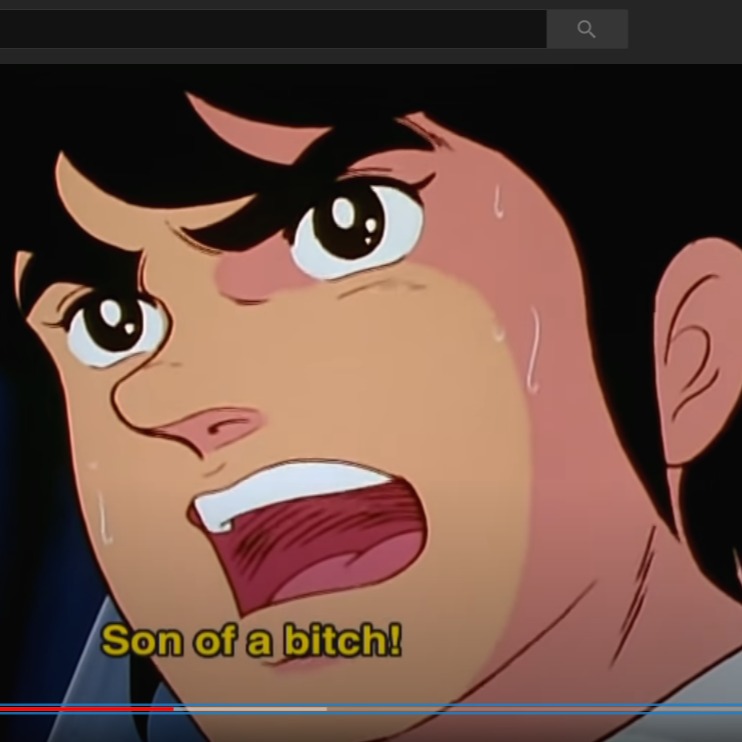티스토리 뷰
----
그만 두지 못하겠느냐.
오니는 우뚝 멈춰섰다. 말투가 아니라, 흐르는 기의 변화를 느낀 탓이다. 이미 너덧 번을 얻어맞아 엉망진창이 된 남자의 콧자락에서 붉은 것이 주륵 흘렀다. 백택은 성가시다는 듯 그것을 소매로 훔쳐 닦았다. 그것은 추호에도 고통이나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저 꼴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얼굴을 구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였다. 그러한 사실이 더욱 오니의 약을 올렸다. 처음의 그것은 한없이 한심스럽다는 의미의 야유였다. 그러나 그것은 차츰 증오로 바뀌어갔다. 오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건방진 것. 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
신기神氣였다. 그것이 둘 사이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니의 한쪽 눈이 찌긋 일그러진다. 흔히 천적 관계라고들 하나, 그것이 한 쪽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터다. 인대가 솟도록 쥐고 있던 쇠몽둥이가 어느새 둔탁한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진다. 그것을 가만 내려다보는 시야가 일렁인다. 머리가 띵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은 흡사 화火의 감정과도 같았다. 무릎이 땅에 떨어지려 하는 것을 간신히 지탱한 다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몰래 느낀다. 그러한 오니의 모습을 가만히 살피는 신수가 짓씹듯이 말을 이었다. 그 눈은 정면에서 오니를 꿰뚫고 있었다.
네놈이 그런다고 하여,
......
한낫 원령에 불과한 혼이 영겁의 신수와 맞먹을 수라도 있을 성 싶으냐?
...제가 어리석어 크나큰 죄를 지었으니, 신수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쏟아지는 현기증에 못 이겨 한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은 호오즈키가 중얼거리듯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깊은 한숨과도 같은 말로, 체념의 표시였다. 짐짓 화가 난 신수의 얼굴에는 별 변화가 없었으나, 오니의 반듯한 사죄에 기세가 한 풀 누그러진 모양이었다. 무엇보다 '신수'라는 호칭을 일종의 인정으로 받아들인 듯하였다.
좋아.
이번에 그의 표정에 흐릿하게 떠오른 것은, 볼 것도 없이 비웃듯한 웃음이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약방을 농밀히 압도하던 기운을 거두어들였다. 휘몰아치는 바람과도 같은 그것에 이미 상당한 양의 약재들이 공기 중과 바닥에 온통 부옇게 날려있었다. 항상 정리정돈으로 말끔했던 공간이 흡사 난장판과도 같은 꼴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에 오니는 그만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눌러 참았다. 머리가 어질거렸다. 그제야 신수는 흡족한 듯 가운 주머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던 약재를 건네주었다.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하니, 이만 가 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니는 꼬박 인사를 하고는 몽둥이를 주워들었다. 암만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오니는 은연 중에 그렇게 생각하였다. 머리가 멍했고, 온몸이 나른했다. 마치 지독한 열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앓아눕기라도 할 것처럼, 우습게도.
-
왔어? 오랜만이네, 오니.
백택은 어린아이처럼 장난스레 웃었다. 몸살에 좋은 약을 타주지, 하는 나긋한 말에 오니는 코웃음을 쳤다. 몽둥이를 부여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당신과 달라서, 잡병 같은 건 걸리지 않습니다.
흐응... 그래?
언뜻 반박의 여지가 많은 말이었으나, 백택은 눈을 흘겨뜨며 가만히 미소했다. 주문했던 것은. 하고 물어오는 말에 천진스레 백택이 대답하였다. 아니, 대답하려 하였다. 거의, 하는 첫 마디와 동시에 눈 앞으로 시커먼 흉기가 날아오지 않았더라면.
----
갑자기 권위적인 신수가 보고싶었던 탓에.
그만 두지 못하겠느냐.
오니는 우뚝 멈춰섰다. 말투가 아니라, 흐르는 기의 변화를 느낀 탓이다. 이미 너덧 번을 얻어맞아 엉망진창이 된 남자의 콧자락에서 붉은 것이 주륵 흘렀다. 백택은 성가시다는 듯 그것을 소매로 훔쳐 닦았다. 그것은 추호에도 고통이나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저 꼴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얼굴을 구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였다. 그러한 사실이 더욱 오니의 약을 올렸다. 처음의 그것은 한없이 한심스럽다는 의미의 야유였다. 그러나 그것은 차츰 증오로 바뀌어갔다. 오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건방진 것. 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
신기神氣였다. 그것이 둘 사이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니의 한쪽 눈이 찌긋 일그러진다. 흔히 천적 관계라고들 하나, 그것이 한 쪽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터다. 인대가 솟도록 쥐고 있던 쇠몽둥이가 어느새 둔탁한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진다. 그것을 가만 내려다보는 시야가 일렁인다. 머리가 띵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은 흡사 화火의 감정과도 같았다. 무릎이 땅에 떨어지려 하는 것을 간신히 지탱한 다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몰래 느낀다. 그러한 오니의 모습을 가만히 살피는 신수가 짓씹듯이 말을 이었다. 그 눈은 정면에서 오니를 꿰뚫고 있었다.
네놈이 그런다고 하여,
......
한낫 원령에 불과한 혼이 영겁의 신수와 맞먹을 수라도 있을 성 싶으냐?
...제가 어리석어 크나큰 죄를 지었으니, 신수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쏟아지는 현기증에 못 이겨 한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은 호오즈키가 중얼거리듯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깊은 한숨과도 같은 말로, 체념의 표시였다. 짐짓 화가 난 신수의 얼굴에는 별 변화가 없었으나, 오니의 반듯한 사죄에 기세가 한 풀 누그러진 모양이었다. 무엇보다 '신수'라는 호칭을 일종의 인정으로 받아들인 듯하였다.
좋아.
이번에 그의 표정에 흐릿하게 떠오른 것은, 볼 것도 없이 비웃듯한 웃음이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약방을 농밀히 압도하던 기운을 거두어들였다. 휘몰아치는 바람과도 같은 그것에 이미 상당한 양의 약재들이 공기 중과 바닥에 온통 부옇게 날려있었다. 항상 정리정돈으로 말끔했던 공간이 흡사 난장판과도 같은 꼴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에 오니는 그만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눌러 참았다. 머리가 어질거렸다. 그제야 신수는 흡족한 듯 가운 주머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던 약재를 건네주었다.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하니, 이만 가 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니는 꼬박 인사를 하고는 몽둥이를 주워들었다. 암만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오니는 은연 중에 그렇게 생각하였다. 머리가 멍했고, 온몸이 나른했다. 마치 지독한 열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앓아눕기라도 할 것처럼, 우습게도.
-
왔어? 오랜만이네, 오니.
백택은 어린아이처럼 장난스레 웃었다. 몸살에 좋은 약을 타주지, 하는 나긋한 말에 오니는 코웃음을 쳤다. 몽둥이를 부여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당신과 달라서, 잡병 같은 건 걸리지 않습니다.
흐응... 그래?
언뜻 반박의 여지가 많은 말이었으나, 백택은 눈을 흘겨뜨며 가만히 미소했다. 주문했던 것은. 하고 물어오는 말에 천진스레 백택이 대답하였다. 아니, 대답하려 하였다. 거의, 하는 첫 마디와 동시에 눈 앞으로 시커먼 흉기가 날아오지 않았더라면.
----
갑자기 권위적인 신수가 보고싶었던 탓에.
'호오즈키의 냉철 > 2차 창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귀백]꿈틀거림 (0) | 2016.06.05 |
|---|---|
| [귀백]여름 장마, 닿지 않는 말 (0) | 2016.05.31 |
| [귀백]거의 모든 것의 DNA (0) | 2016.05.21 |
| [귀백]경화수월 (0) | 2016.05.17 |
| [귀백]거의 모든 것의 역사 (0) | 2016.05.12 |
댓글